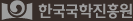사행단 구성
비용
사행에 참여하는 인원에게는 노비(路費)가 지급되었다. 기본이 되는 경외 노비(京外路費)는 호조에서 하사하는 의자(衣資)와 원반전(元盤纏)과 별반전(別盤纏), 별간구청(別間求請)의 형태로 지급된다.
의자(衣資)에 대한 내용
의자
의자(衣資)란 의복 등의 물자를 말한다. 정사(正使)와 부사(副使)가 각기 백저포(白苧布: 흰 모시) 5필, 백면주(白綿紬) 6필, 목면(木棉)ㆍ정포(正布) 각각 15필을, 따로 쌀[賜米]15가마를 받았다.
반전
반전(盤纏)이란 노자(路資)를 말한다. 원반전(元盤纏)과 별반전(別盤纏)으로 나뉜다. 원반전에 포함되는 품목은 백저포, 백지(종이), 청서피, 호초(후추) 등이 있다. 별반전은 녹피(사슴가죽), 수달피, 소연죽, 지삼초(담뱃잎), 장연죽 등이 포함된다.
별간구청
별간구청은 별구청(別求請)으로 사신이 외국에 나가거나 돌아올 때 경유하는 지방 관아에서 관례로 받는 경비 외에 따로 더 청하는 여비를 말한다. 은장도와 청서피, 백지, 소갑초, 의롱, 초석(돗자리) 등이 있었다.
지역[外方]에서 관례상 보내는 노자
경상도ㆍ전라도ㆍ강원도ㆍ함경도는 사행 노정에 비껴있기 때문에 각 고을별로 수송하여 바쳤다. 경상도와 전라도[兩南]에서 보내는 쌀이 각각 321석, 290석으로 총 611석이다. 이를 정사 305석 7두 5승, 부사 229석 7두 5승, 서장관 76석으로 차등을 두어 나누었다. 황해도와 평안도는 사행이 지나는 길에 바쳤다.
사행원 스스로 마련해야 했던 사미와 노자
미(賜米)와 의자(衣資)는 사행원이 각각 스스로 받아서 사용하였다. 원반전ㆍ별반전과 8도에서 보내오는 노자를 모아 북경으로 가는 노정의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예단을 확보해 놓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삼사 이하 역졸에 이르기까지 사행 구성원 모두의 노비로 삼았다. 다만 호조와 선혜청에서는 별도의 청구 절차 없이 관례에 따라 지급하였다. 경상도 이하 6도에서는 사행이 각각 여러 고을에 서신을 보내어 노자를 요구했다. 그러나 각 고을마다 경제적 여건이 다르고, 고을 수령의 뜻도 달라 어느 지역에서는 물건이 풍족하게 오고, 어느 지역에서는 적게 보냈고, 빨리 보내주는 곳도 있었지만 사행이 출발하도록 보내오지 않는 곳도 있었다. 결국 도강하는 날까지 사행단의 노비를 확정지을 수 없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사행 노정의 해당 지역에 보내는 예단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사행은 원칙적으로 조선의 왕과 중국의 황제 사이의 일이었으므로 사행단과 각 지방 관원과의 교류는 엄금했다. 그러므로 뇌물수수를 규례처럼 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문서로 남겨둘 수는 더더욱 없었다.
예물을 주지 않으면 발목 잡힌다!
본래 사행 노정에 있는 각 지방 관청과 명나라의 예부(禮部)에 주는 예물은 부채와 모자 등의 물품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다 광해군 때에 주청(奏請)하는 일로 은자 수만 냥을 뇌물로 보낸 뒤로 중국의 관리들은 조선 사신의 행차를 이익을 구할 수 있는 기회[奇貨]로 여기게 되었다. 각 지방 관청의 책임자는 물론 사행을 보호하기 위해 차출된 군사들, 북경 숙소의 관리자들은 공공연하게 갖고 싶은 물품의 목록을 보냈고, 목록에 있는 물품 가운데 빠진 것이 있거나 요구하는 수량만큼 주지 않으면 갖은 핑계를 써서 사행단의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사행단의 노비는 중앙 정부에서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신이 개인적으로 각 지방 관아에 청구해서 받아 써야 했다. 늘 부족했기에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였고, 번번이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 궁여지책으로 사행에 참여한 역관과 상인들에게 융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역관과 상인은 이를 벌충한다는 핑계로 교역에 필요한 시간과 명분을 얻게 되어, 사행을 고의로 지연시키기도 하였다.
사행의 난감함을 숙종에게 고하다
사행의 이런 난감한 처지는 1698년(숙종 24) 숙종에게 올린 최석정의 말에 잘 드러나 있다.
“우리나라 사신이 연경에 갈 때에 노비는 관례에 따라 지방 관아에서 요청합니다. 삼사가 사사롭게 요구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 물건을 준비하여 보낸 준 뒤에는 군관으로 하여금 답장을 쓰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서들은 모두 관인(官印)을 찍지 않은 사사로운 문서입니다. 국가의 중대한 일을 그렇게 처리하니 일이 구차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를 빙자하여 간사한 짓을 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중국 땅에 도착한 다음에도 봉황성에서 연경에 이르기까지 예단을 주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행의 구성원은 매번 바뀌다보니, 뒷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는 책자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연경에 갈 때에 전례가 있는가 물어보고, 그 보고 들은 것을 참고하여 한 권의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책자에는 사행 노정의 각처에 사용해야 할 수량을 자세히 기록한 뒤에 관인을 찍고 서명을 남겨, 뒤의 사행에 참고하는 자료로 삼도록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와 같은 외교의 일은 행인사(行人司)라는 관청을 두어 전적으로 맡아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겨우 승문원(承文院)이 중국에 주고받는 공식 문서(事大文書)만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행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곳이 없으니, 제 생각으로는 마땅히 행인사를 설치하여 예조의 당상관 1명과 승문원의 제조(提調: 책임자) 1명을 그 책임자로 삼고, 예조와 승문원의 관원 가운데 2~3명을 뽑아 실무자 역할을 겸직하게 하면 일이 착실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결정하기 어려우시니 조정에서 의논을 해보십시오.
하지만 삼사가 편지를 보내어 노비를 요구하는 일만은 바꾸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비변사에서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공식적인 문서[關文]을 보내고, 관찰사들로 하여금 각 고을에 명령을 내려 관례대로 준비해서 보내게 하십시오. 물건을 받은 삼사는 잘 받았다는 문서를 만들어 관인을 찍어 보내게 하면, 외교의 일이 잘 정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