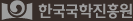이야기 조각보
사건
군관과 역관들은 모두 관복을 갖춰 입었으나, 나의 옷차림은 종과 별반 다를게 없었다. 그러나 나는 표범가죽과 털옷을 입고 종까지 두고 있었기에 만주족 사람들이 눈여겨 보았다. 그래서 결국 표범가죽 털옷을 벗고 종을 물린 채 하인들 틈에 섞여 두루 구경하였다. 내가 누구인지 묻는 자가 있으면 이곳 사람들이 종을 일컫는 '빵즈'라고 대답했다. 만주인들은 평상시 검정색 옷을 입어 귀천의 구별이 없었는데, 오늘은 모두 관복을 갖추어 입었다. 관복은 피견(被肩)ㆍ접수(接袖)ㆍ마척흉(馬踢胷) 등으로 불리는 것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머리에 쓰는 모자와 대판(帶版)ㆍ방석ㆍ보복(補服)은 등급에 따라 모양이 각각 달랐다. 우리나라는 스스로 '관복을 잘 갖춘 나라'라고 말하지만, 신분의 귀천과 등급을 분별하는 장식은 고작 허리띠와 망건 옆에 매다는 줄인 관자 정도에 불과하다. 보복의 경우에는 애당초 문무 귀천을 구분하지 않았다. 이곳 사람들은 풍모가 장대한데다 자태가 당당한 사람들이 많았다.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둘러보니 본래 왜소하고 마른 데다 또 먼 길을 여행하느라 풍파에 시달린 뒤였기 때문에 세 사신을 제외하고 모두 꾀죄죄했다. 입고 있는 의관도 대부분 여기에 와서 돈을 주고서 빌린 것이기 때문에 도포는 길이가 맞지 않고 모자 역시 커서 눈까지 내려왔다. 온전한 사람 같아 보이지 않으니 더욱 한탄스러웠다.
번역문 군관과 역관들은 모두 관복을 갖추어 입었는데, 나의 옷차림은 종들과 별로 구별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표범가죽 털옷을 입고 종까지 두고 있었기에 만주족 사람들 중에 나를 눈여겨보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나는 결국 표범가죽 털옷을 벗고 종도 물리치고서 하인들 틈에 섞여 두루 구경하였다. 내가 누구인지 묻는 자가 있으면 ‘빵즈[幇子]’라고 대답했다. ‘빵즈’란 이곳 사람들이 종을 일컫는 말이다.
만주인 한 사람이 김덕삼(金德三)의 손바닥에 글씨를 써서 세 사신의 나이와 벼슬을 묻고 또 나에 대해서까지 물었다. 내가 김덕삼에게 눈짓하니, 김덕삼은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재차 캐묻자 김덕삼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라고 말해서 그의 말을 막았다. 김덕삼이 그의 벼슬을 묻자, 그는 낮은 관리라고 대답했다.
만주인들이 평상시에 입는 옷은 모두 검정색으로 귀천의 구별이 없었는데, 오늘은 모두 관복을 갖추어 입었다. 관복은 피견(被肩)ㆍ접수(接袖)ㆍ마척흉(馬踢胷) 등으로 불리는 것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머리에 쓰는 모자와 대판(帶版)ㆍ방석ㆍ보복(補服)은 등급에 따라 모양이 각각 달랐다.
모자는 홍석(紅石)을 박은 게 가장 높은 것이고, 그 다음은 남석(藍石), 그 다음은 소람석(小藍石), 그 다음은 수정을 박았다. 아무것도 박지 않은 모자는 낮은 사람의 것이다. 대판은 옥으로 만든 게 가장 높은 것이고, 그 다음은 기화금(起花金), 그 다음은 소금(素金)으로 만든다. 양뿔로 만든 것은 낮은 사람의 것이다.
방석은 머리와 발톱이 달린 호랑이 가죽이 가장 높은 것이고, 그 다음은 머리와 발톱이 없는 호랑이 가죽, 그 다음은 이리 가죽, 그 다음은 오소리 가죽, 그 다음은 담비 가죽, 그 다음은 야생 양 가죽, 그 다음은 사슴 가죽으로 만든 것이었다. 흰색 털로 짠 방석은 낮은 사람의 것이다. 여름에 3품 이상의 관리는 붉은색 털로 짠 방석에 앉고, 4품 이하는 모두 흰털로 짠 방석에 앉는다고 한다.
큰 예식을 거행할 때 입는 보복(補服)의 경우 문관은 날짐승을 새기고 무관은 들짐승을 새기는데, 이것은 모두 명나라 제도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었다. 안에 입는 옷은 길이가 복사뼈에까지 온다. 또 소매는 좁고 옷깃은 넓다. 겉옷은 길이가 허리에까지만 오고 두 소매는 팔꿈치까지만 온다. 이것을 접수라고 한다.
비단 폭을 둥글게 재단한 다음 머리가 들어갈 구멍을 파놓은 게 있다. 그 구멍으로 머리를 넣으면 비단이 어깨를 덮고 앞뒤의 옷깃을 덮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피견이라 한다. 피견과 안팎의 옷은 모두 검은데 네 마리의 구렁이를 수놓은 게 높은 것이다. 보복은 밖에 입고 허리띠를 안에 둘렀는데, 문무 4품 이상이라야 구슬 몇 개를 달고 마척흉(馬踢胷)을 매는 게 허락된다. 마척흉의 제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이러한 복색은 화려하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어도 귀천과 등급을 확정지어서 문란하지 않게 한다.
우리나라는 스스로 ‘관복을 잘 갖춘 나라[冠帶之國]’라고 말하지만, 신분의 귀천과 등급을 분별하는 장식은 고작 허리띠와 망건 옆에 매다는 줄인 관자(貫子) 정도에 불과하다. 보복의 경우에는 애당초 문무 귀천을 구분하지 않았다. 부사(副使)도 선학(仙鶴)을 새겨 넣어서 정사(正使)이신 큰형님과 똑같은 문양을 달았다. 등급이 문란한 모습에 쓴 웃음이 났다.
이곳 사람들은 풍모가 장대한데다 자태가 당당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둘러보니 본래 왜소하고 마른 데다 또 먼 길을 여행하느라 풍파에 시달린 뒤였기 때문에 세 사신을 제외하고 모두 꾀죄죄했다. 입고 있는 의관도 대부분 여기에 와서 돈을 주고서 빌린 것이기 때문에 도포는 길이가 맞지 않고 모자 역시 커서 눈까지 내려왔다. 온전한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으니 더욱 한탄스러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