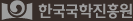이야기 조각보
사건
신민에서 글씨를 자랑하기 위해 전당포에서 ‘기상새설(欺霜賽雪)’이라는 글씨를 써주었더니, 주인은 이게 아니라고 했다. 나는 촌놈이 뭘 아냐며 투덜거렸다. 다음날 연산관의 한 상점에서 글씨 자랑을 하는 남자를 보니 필법이 옹졸하고 간신히 글자 모양을 갖출 뿐이어서, 내가 글씨를 뽐낼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먹을 들어 거침없이 커다랗게 ‘신추경상(新秋慶賞)’이라 써 갈겼다. 사람들이 글씨를 보더니 조선사람이 글씨를 잘 쓴다며 좋아하고, 차를 가져다주고, 담배를 주며 태도가 달라졌다. 그들은 모두 수식포를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 중 한 사람이 붉은 종이를 가져와 내게 글씨를 써달라고 했다. 그러기에 전날 전당포 주인에게 써준 ‘기상새설(欺霜賽雪)’을 또 써주고 맞는지 물어보자 여기는 국수집이 아니라고 했다. 그제서야 나의 잘못을 깨달았으나 아무렇지 않은 듯 심심해서 써봤다고 얼버무렸다. 그에게 ‘부가당(副珈堂)’이라는 글씨를 써주고 주인이 부인들의 장신구를 전문으로 취급한다고 해서, 『시경(詩經)』에 나오는 ‘부계육가(副(笄六珈)’라는 말에서 따와서 쓴 것이라 일러주었더니 무척 고마워했다. 그 후부터 점포 앞에 ‘기상새설(欺霜賽雪)’이라는 4글자가 쓰여 있으면 국수집임을 알아보았다.
번역문 이날 밤 달빛이 대낮처럼 밝았고 더위는 한물 간 모양이었다. 저녁 식사 후에 밖으로 나가서 아득히 먼 들판을 바라보니, 푸른 개천이 땅에 깔려 흐르고 소와 양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상점은 아직 모두 문을 닫지 않았다. 그 중 한 집에 들어가니, 뜰 가운데 시렁을 높이 매고 갈대 자리를 덮어 두었는데 밑에서 끈을 당기면 그 자리가 걷어져서 달빛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이상하게 생긴 화초가 달빛 아래 얽혀 있었다.
길에서 놀던 사람들이 내가 상점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왔다. 뜰에 사람이 가득해졌다. 다시 일각문을 들어서자 앞뜰만큼 넓은 뜰이 있고, 난간 아래에는 푸른 파초 몇 그루가 심어져 있었다. 사람 4명이 탁자를 가운데 놓고 삥 둘러앉아 있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탁자를 차지하고 ‘신추경상(新秋慶賞)’이라는 넉 자를 썼다. 불그스레한 종이에 자주색 먹으로 쓴데다 흰 달빛에 반사되어 똑똑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붓놀림이 아주 서둘러서 간신히 글자 모양만 이루는 정도였다. 나는 마음속으로, ‘필법이 저렇게 옹졸하니, 내가 한번 뽐내볼 때로구나.’라고 생각하였다. 여러 사람들이 그 못난 글씨를 다투어가면서 구경하고, 곧 당 앞 한가운데 문설주 위에 붙였다. 달구경을 기념하여 써 붙인 것이다. 그런 다음 그들은 모두 일어나 당 앞으로 가서 뒷짐을 지고 구경했다.
아직 탁자 위에 종이가 남아 있기에, 내가 걸상에 가 앉아서 남은 먹을 진하게 묻혀 거침없이 커다랗게 ‘신추경상(新秋慶賞)’이라 써 갈겼다. 그 중 한 사람이 내가 쓴 글씨를 보고, 여러 사람들에게 소리쳐 모두 탁자 앞으로 달려왔다. 서로 웃고 떠들며 말했다.
“조선 사람이 글씨 참 잘 쓰네.”
“동이(東夷)도 글씨가 우리와 같네.”
“글자는 같지만 음은 다르다네.”
나는 붓을 턱하니 던지고 일어섰다. 그러자 여러 사람이 내 손목을 잡으면서 말했다.
“영감님, 잠깐만 앉으세요. 존함이 어찌 되십니까?”
내가 이름을 써 보이자 더욱 기뻐한다. 그들은 내가 처음 들어올 때는 반가워하기는커녕 본체만체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글씨를 써보이자 분에 지나친 듯 반기는 기색이다. 성급히 차 한 잔을 내오고 또 담배에 불을 붙여 권한다. 순식간에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그들은 모두 태원(太原) 분진(汾晉)에 사는 사람으로, 지난해에 이곳에 와서 장식품 가게를 열었다고 한다. 차(釵)ㆍ비녀ㆍ잠ㆍ귀걸이ㆍ가락지와 같은 물건을 사들여 가게를 열고 가게 이름을 ‘만취당(晩翠堂)’이라고 했다. 그 중 셋은 성이 최(崔) 씨였고, 둘은 유(柳) 씨와 곽(霍) 씨였는데, 모두 문필(文筆)이 아주 짧아보였다. 그중 곽 씨가 가장 나아보였다.
…(중략)…
마침 한 사람이 붉은 종이를 가지고 와서 글씨를 써 달라고 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마다 아는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사람들이 점점 늘어갔다. 내가 말했다.
“붉은 종이엔 글씨가 잘 되지 않으니 계란빛 종이를 가져 오시오.”
한 사람이 서둘러 나가더니 백지 몇 장을 가져 왔다. 나는 그것을 잘라 주련(柱聯)에 쓸 모양으로 만들고는 다음과 같이 썼다.
늙은이가 즐기는 건 산과 숲이라오 / 翁之樂者山林也
당신도 물과 달의 풍치를 알겠지요? / 客亦知否水月乎
여러 사람들이 좋아라 환호성을 지른다. 서로 다투어 먹을 갈고 왔다갔다 분주하였다. 모두 종이를 구하느라 그러는 모양이었다. 나는 이에 종이를 펴고 쓰며 쉴 새 없이 붓을 내달렸는데, 고소장에 판결문을 쓰듯 후다닥 써내려갔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했다.
“영감은 술을 자실 줄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대답했다.
“한 잔 술이야 어찌 사양하겠소?”
사람들이 모두 크게 한바탕 웃고는 곧 따끈한 술 한 주전자를 가져 와서 연거푸 석 잔을 권한다. 내가 사람들에게 물었다.
“주인께서는 어째서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다.
“술을 마실 줄 아는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여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서로 능금과 포도 등을 가져다 내게 권한다. 내가 말했다. “달빛이 비록 밝긴 하지만 글씨 쓰기엔 어두운 편이니 촛불을 켜는 게 좋겠소.”
그러자 곽생(郭生)이 말했다.
“하늘 위에 저 한 조각 거울이 달려 있으니, 이 세상 천만 개의 등불보다 낫지 않소이까.”
어떤 사람이 말했다.
“영감, 시력이 좋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곧 촛불 4대를 가져와 밝혀 주었다.
나는 갑자기 생각했다.
“어제 전당포에서
그래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주인댁 점포 앞에 걸어둘 만한 액자를 쓰면 어떻겠소?”
그러자 그들이 일제히 말했다.
“그거 좋겠습니다!”
내가 드디어 ‘기상새설(欺霜賽雪)’이라는 4글자를 썼다. 그러자 서로 쳐다보며 의아해하는 모습이 어제 전당포 주인의 안색과 똑같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거 또 이상스런 일이구나.’라고 생각하고는, 다시 물었다.
“이게 적당하지 않을까요?”
그러자 그들이 함께 적당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곽 씨가 이어서 말했다.
“저희 가게는 여인들의 장신구를 파는 집이지 국숫집이 아닙니다.”
나는 그제야 비로소 내 잘못을 깨달았다. 전에 한 일이 부끄럽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듯 얼버무렸다.
“저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단지 심심풀이로 써보았을 뿐입니다.”
이전에 요양(遼陽)의 어느 점포에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내가 대답했다.
“귀하의 가게에서는 부인들의 장신구를 전문으로 취급한다고 하셔서, 『시경(詩經)』에 나오는
그러자 곽생이 고마워하며 말했다.
“저의 집을 빛내주신 그 은덕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다음날 북진묘(北鎭廟)를 구경하기로 약속했었기 때문에 일찍 숙소로 돌아왔다. 우리 일행의 여러 사람들에게 아까 일을 이야기하니 모두 배를 잡고 웃었다. 그 뒤로는 점포 앞에 ‘기상새설’이라는 4글자가 써 있으면 반드시 국숫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은 자기의 마음을 밝고 깨끗하게 지키라는 뜻이 아니라 국숫집의 면발이 서릿발처럼 가늘고 눈보다 희다는 것을 자랑하는 뜻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눈보다 흰 밀가루를 ‘진말(眞末)’이라고 부른다.